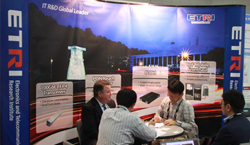노란 가을을 느릿느릿 밟는 맛
한바탕 마을 축제가 끝나고, 제법 쌀쌀해진 바람과 함께 노란 은행잎이 잔뜩 땅에 떨어졌다. 하지만 아직 가을과 작별인사하기에는 이르다. 마을 길목마다 쌓인 은행잎과 아직 생생히 잎을 달고 있는 몇몇 은행나무만으로도 가을을 느끼기에 충분하기 때문이다. 사실, 가을은 보는 맛을 넘어 밟는 맛에 있을지도 모른다. 바로 이곳, 청라 은행마을에서라면 더욱 그렇다.

자연이 듬성듬성 채워놓은 은행나무들
청라 은행마을은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 최대의 은행나무 군락지를 이루고 있다.
마을 어귀에 들어서자, 누군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대번에 이곳이 은행마을 임을 알 수 있었다. 어귀에서부터 은행나무 열매 냄새가 훅하고 코끝을 자극했다.

은행나무들이 뭔가 정렬되고, 멋스럽게 늘어서 있는 풍경만을 기대했던 사람이라면 조금 실망할 수도 있겠다.
이곳의 은행나무들은 제멋대로 삐뚤삐뚤 자라 듬성듬성 마을을 채우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래서 좋다. 누군가가 인위적으로 심은 것이 아닌 자연이 스스로 채우고 키웠기에 편안하게 느껴진다.


이곳의 은행나무들은 첫서리가 내린 후 10월 말부터 11월 초 무렵 노랗게 물들기 시작하는데,
그즈음에 마을 축제가 열린다. 거창한 축제라기보다는 마을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 소박한 행사로, 시골 마을 사람들의 넉넉한 인심과 흥겨움을 느낄 수 있다.

축제를 열 정도로 마을에 은행나무가 많이 자라게 된 데에는 한 가지 전설이 있다.
예로부터 장현마을(청라 은행마을)의 뒷산은 산세가 뛰어나고 골이 깊어 짐승들이 많이 살았다고 한다.
특히 까마귀가 많이 살고 있어 ‘까마귀 산(오서산)’이라고 불려왔다. 산 아래쪽 작은 연못에는 마을을 지키는 누런 구렁이가 한 마리 있었는데,
천 년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기도를 해 결국 황룡이 되어 여의주를 물고 하늘로 올라갔다. 이 광경을 멀리서 넋을 놓고 지켜본 까마귀들은 몇 년 후
바닥에 떨어진 노란 은행 열매를 발견하고, 이것을 여의주라고 여겼다.
그 이후 자기들이 사는 이곳에 가져와 정성스럽게 키우면서 장현마을에 은행나무가 자라나게 되었다고 한다.


은행나무를 여의주로 여긴 까마귀 이야기는 믿거나 말거나이지만 이렇게 하나둘 자리 잡기 시작한 은행나무들은 어느새 3,000여 그루의 규모를 이루고 있다.
예전에 은행나무는 ‘대학나무’로도 통했다. 몇 그루만 있으면 자녀들을 대학에 보낼 만큼의 수입을 줬기 때문이다.
현재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은행나무는 여전히 마을 사람들의 소중한 수입원이 되고 있다.
연간 100여 톤가량의 은행나무 열매를 생산한다고 하니, ‘은행 털어 대박 난 마을’이라는 이 마을의 애칭은 그저 농담만이 아닌 셈이다.
마을을 거닐다 보면 곳곳에서 은행나무 열매를 줍는 마을 주민들과 마주칠 수 있었다.
넉넉히 비워진 신경섭 가옥의 풍경
노란 잎들을 밟으며 마을 둘레길을 느릿느릿 걷다 보면 어디라고 알려줄 것도 없이 어느새 신경섭 가옥에 다다른다.
조선 후기에 지어진 신경섭 가옥은 ‘ㄱ’자 형태의 사랑채와 ‘ㅡ’자 형태의 안채가 어우러진 팔작지붕 전통 가옥으로, 단청이 옛 모습 그대로
남아 있을 정도로 보존 상태가 좋은 편이다.

대문에는 붉은색 현판을 볼 수 있는데, 바로 효자나 열녀 등이 있음을 나타내는 ‘정려문’이다.
이곳에 살던 신석붕이라는 사람이 평소 부모에 대한 효행이 지극하고 동기간에 우애가 돈독해 세워진 것이라고 한다.


현재 가옥은 사람이 살았던 흔적만 남아 있을 뿐, 누군가가 살고 있지는 않은 듯했다.
다만 이곳을 거처 삼은 들고양이 한 마리만이 기웃거리고 있을 뿐이다.

전통적인 가옥의 고풍스러운 모습도 멋스럽지만, 이곳의 백미는 무엇보다 너른 마당과
나지막한 담장 너머의 풍경이 자아내는 아름다움이다.
500살이 넘는 수은행나무를 비롯해 100살이 넘은 다양한 고목들이 담장 안과 밖을 에워싸고 있는데,
사랑채 마루에 앉아 넉넉히 비워진 그 풍경을 바라보면 마치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은 느낌을 준다.


그래서 이곳은 사람들로 붐비는 축제가 아닌, 다소 한적하고 조용한 마당을 볼 수 있는 이맘때 방문하는 것도 참 매력이 있다.
그 매력을 아는 사람들이 종종 이곳을 찾아 마당과 집 주변을 거닐며 가을의 끝자락을 즐긴다.

마을 이곳저곳을 한참 둘러보고 집으로 돌아오니, 신고 온 신발에 잔뜩 노란 은행 물과 특유의 향취가 잔뜩 배어 있었다.
아마도 꽤 오랫동안 남게 될 그 흔적만큼, 청라 은행마을과 신경섭 가옥에서 느꼈던 넉넉한 아름다움의 여운 역시 오랫동안 남아 있을 것이다.
아직 넉넉히 남아있다. 겨울 눈이 낙엽들을 모두 감싸기 전에 이곳에 남아 있는 가을을 품고 올 기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