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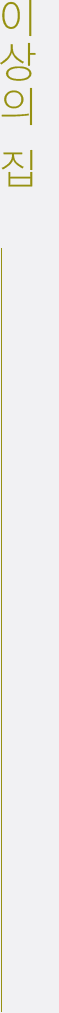
작가 이상(李箱)의 흔적을 찾아서
경복궁역 2번 출구. 차들로 빽빽한 거리를 뒤로하고 자하문로를 따라 걷다 보면 작은 골목과 마주하게 된다. 그 골목에는 자세히 살펴보지 않으면 놓치고 지나갈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바로 작가 이상을 추억하고자 만들어진 ‘이상의 집’이다.
이상은 1920-30년대 오감도, 날개 등 파격적인 문장으로 한국문단에 파문을 몰고온 시인이자, 소설가이다. 그가 남긴 작품들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지만 그를 추억할 수 있는 공간을 찾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런 이상을 추억하고 기릴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이상의 집이다. 그가 성장했던 세월의 흔적을 보존하거나 복원한 공간은 아니지만 이상의 짧은 생애 중 대부분의 시간을 머물렀던 ‘공간’ 그 자체에 의미를 두고 탄생했다.
큐레이터 이은정 씨는 이상의 집을 이렇게 설명했다.
“이곳은 이상이 어린 시절부터 청년이 될 때까지 살았던 ‘집터’에 새로 지어진 한옥입니다. 그의 작품을 사랑하는 여러 건축가와 디자이너가 모여 그를 기리는 공간으로 재탄생시킨 것이죠. 과거 이곳은 유년시절 이상이 올려다본 하늘 아래 그가 밟았을 땅, 그가 걸었을 골목이었겠지요. 그런 의미를 두고 이 공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거리를 지나치는 사람들, 이상을 사랑하는 분들이 차도 마시고 책도 읽으면서 자유롭게 머물렀다 가실 수 있는 공간이기를 바랍니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면 사람들이 자유롭게 오가며 머무를 수 있도록 마련된 테이블과 의자가 놓여 있다. 책장에는 그의 작품과 관련된 서적 100여 권이 꽂혀있지만, 사실 그를 설명하는 자료는 1936년 소설 날개를 실은 잡지 ‘조광’과, 1924년 시 오감도를 연재한 ‘조선중앙일보’가 전부다. 그러나 이곳에는 이상이라는 인물과 장소를 기념하는 방식에 대한 새로운 실험공간이 있다. ‘이상의 방’이라 이름 붙여진, 그가 살았던 쪽방과도 같은 좁고 어두운 공간이다. 묵직한 철문을 열어보니 왼쪽 벽으로는 이상의 일대기를 보여주는 영상화면이 흘러나오고, 오른쪽으로는 2층으로 이어진 계단이 있다. 그곳에는 어두운 공간과 대조되는 한 줄기의 빛이 벽에 걸려있는데, 빛과 여백이 만들어내는 아득한 세계가 펼쳐진다. 계단을 올라가 보니 한사람 정도 설 수 있는 공간이 나오는데 그곳에 서서 서촌의 품속에서 이상이 걸었을 골목을, 올려다보았을 하늘을 마주해 본다.
경복궁역 2번 출구. 차들로 빽빽한 거리를 뒤로하고 자하문로를 따라 걷다 보면 작은 골목과 마주하게 된다. 그 골목에는 자세히 살펴보지 않으면 놓치고 지나갈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바로 작가 이상을 추억하고자 만들어진 ‘이상의 집’이다.
이상은 1920-30년대 오감도, 날개 등 파격적인 문장으로 한국문단에 파문을 몰고온 시인이자, 소설가이다. 그가 남긴 작품들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지만 그를 추억할 수 있는 공간을 찾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런 이상을 추억하고 기릴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이상의 집이다. 그가 성장했던 세월의 흔적을 보존하거나 복원한 공간은 아니지만 이상의 짧은 생애 중 대부분의 시간을 머물렀던 ‘공간’ 그 자체에 의미를 두고 탄생했다.
큐레이터 이은정 씨는 이상의 집을 이렇게 설명했다.
“이곳은 이상이 어린 시절부터 청년이 될 때까지 살았던 ‘집터’에 새로 지어진 한옥입니다. 그의 작품을 사랑하는 여러 건축가와 디자이너가 모여 그를 기리는 공간으로 재탄생시킨 것이죠. 과거 이곳은 유년시절 이상이 올려다본 하늘 아래 그가 밟았을 땅, 그가 걸었을 골목이었겠지요. 그런 의미를 두고 이 공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거리를 지나치는 사람들, 이상을 사랑하는 분들이 차도 마시고 책도 읽으면서 자유롭게 머물렀다 가실 수 있는 공간이기를 바랍니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면 사람들이 자유롭게 오가며 머무를 수 있도록 마련된 테이블과 의자가 놓여 있다. 책장에는 그의 작품과 관련된 서적 100여 권이 꽂혀있지만, 사실 그를 설명하는 자료는 1936년 소설 날개를 실은 잡지 ‘조광’과, 1924년 시 오감도를 연재한 ‘조선중앙일보’가 전부다. 그러나 이곳에는 이상이라는 인물과 장소를 기념하는 방식에 대한 새로운 실험공간이 있다. ‘이상의 방’이라 이름 붙여진, 그가 살았던 쪽방과도 같은 좁고 어두운 공간이다. 묵직한 철문을 열어보니 왼쪽 벽으로는 이상의 일대기를 보여주는 영상화면이 흘러나오고, 오른쪽으로는 2층으로 이어진 계단이 있다. 그곳에는 어두운 공간과 대조되는 한 줄기의 빛이 벽에 걸려있는데, 빛과 여백이 만들어내는 아득한 세계가 펼쳐진다. 계단을 올라가 보니 한사람 정도 설 수 있는 공간이 나오는데 그곳에 서서 서촌의 품속에서 이상이 걸었을 골목을, 올려다보았을 하늘을 마주해 본다.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헌책방
1951년, 조대식 할아버지와 권오남 할머니는 자신들의 이름에서 한 자씩 따와 작은 헌책방을 차렸다. 그 이름은 ‘대오서점’. 하얀 바탕 위에 검은 글씨로 ‘대오서점’이라 적힌 간판은 부분마다 페인트칠이 벗겨져 있어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다. 지금은 서점의 기능이 사라졌지만, 대오서점이 유지되기를 원하는 많은 사람들의 바람으로 안채를 볼 수 있는 ‘대오서점 카페’로 재탄생 됐다. 방이었던 공간을 개조해 할머니가 사용했던 손때 묻은 서랍장, 학교에나 어울릴 법한 책걸상, 그리고 교과서들을 비치했다. 대청마루, 처마 아래 공간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빼곡하게 책을 쌓아두었는데, 오랜 세월의 향기가 코끝에서 맴돌았다. 지나온 세월을 따라 책의 색이 누렇게 바랬지만 어른들에게는 추억을, 젊은 사람들에게는 따뜻함을 주는 정겨운 곳이다.
엽전으로 물건과 음식을 살 수 있는 통인시장
서촌의 중심에 위치하고, 주택가 사이에 자리잡은 통인시장도 꼭 들러야 하는 서촌의 명소이다. 규모가 그리 크진 않지만, 통인시장에는 다른 시장에서 만나볼 수 없는 특별함이 있다. 시장 안에 있는 고객행복센터에서 도시락통을 사면 ‘엽전’을 주는데, 이 엽전으로 시장 곳곳에서 먹고 싶은 음식을 살 수 있다. 고른 음식을 도시락통에 담아 카페에 앉아 먹을 수 있어 색다른 재미를 준다.
여기저기 반찬, 모둠전, 튀김 등 맛있는 냄새가 솔솔 풍겨오는데 단연 눈길을 끄는 것은 ‘기름 떡볶이’이다. 시장 구경엔 뭐니뭐니해도 먹는 게 남는 것이니, 먹어보지 않고 그냥 지나칠 수는 없는 법. 조리방법은 특별한 것이 없다. 미리 고추장 양념이 된 떡을 기름으로 넉넉히 두른 무쇠 솥뚜껑에 볶는 것이 전부다. 새끼손가락만한 떡볶이를 한입에 넣자 마자 평상시에 맛보던 떡볶이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맛이 서서히 입안으로 번졌다.
이밖에도 시장통 중간 중간에서 만나는 골목길도 무척이나 정겹다. 발길 닿는대로 걷다보면 너울너울 이어진 한옥 골목길이 나오는데, 대체로 집들은 아담하며 소박하다. 사람이 살 것 같지 않아 굳게 닫힌 대문 틈으로 내부를 엿보니 가지런히 신발 몇 켤레가 놓여있다.
1951년, 조대식 할아버지와 권오남 할머니는 자신들의 이름에서 한 자씩 따와 작은 헌책방을 차렸다. 그 이름은 ‘대오서점’. 하얀 바탕 위에 검은 글씨로 ‘대오서점’이라 적힌 간판은 부분마다 페인트칠이 벗겨져 있어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다. 지금은 서점의 기능이 사라졌지만, 대오서점이 유지되기를 원하는 많은 사람들의 바람으로 안채를 볼 수 있는 ‘대오서점 카페’로 재탄생 됐다. 방이었던 공간을 개조해 할머니가 사용했던 손때 묻은 서랍장, 학교에나 어울릴 법한 책걸상, 그리고 교과서들을 비치했다. 대청마루, 처마 아래 공간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빼곡하게 책을 쌓아두었는데, 오랜 세월의 향기가 코끝에서 맴돌았다. 지나온 세월을 따라 책의 색이 누렇게 바랬지만 어른들에게는 추억을, 젊은 사람들에게는 따뜻함을 주는 정겨운 곳이다.
엽전으로 물건과 음식을 살 수 있는 통인시장
서촌의 중심에 위치하고, 주택가 사이에 자리잡은 통인시장도 꼭 들러야 하는 서촌의 명소이다. 규모가 그리 크진 않지만, 통인시장에는 다른 시장에서 만나볼 수 없는 특별함이 있다. 시장 안에 있는 고객행복센터에서 도시락통을 사면 ‘엽전’을 주는데, 이 엽전으로 시장 곳곳에서 먹고 싶은 음식을 살 수 있다. 고른 음식을 도시락통에 담아 카페에 앉아 먹을 수 있어 색다른 재미를 준다.
여기저기 반찬, 모둠전, 튀김 등 맛있는 냄새가 솔솔 풍겨오는데 단연 눈길을 끄는 것은 ‘기름 떡볶이’이다. 시장 구경엔 뭐니뭐니해도 먹는 게 남는 것이니, 먹어보지 않고 그냥 지나칠 수는 없는 법. 조리방법은 특별한 것이 없다. 미리 고추장 양념이 된 떡을 기름으로 넉넉히 두른 무쇠 솥뚜껑에 볶는 것이 전부다. 새끼손가락만한 떡볶이를 한입에 넣자 마자 평상시에 맛보던 떡볶이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맛이 서서히 입안으로 번졌다.
이밖에도 시장통 중간 중간에서 만나는 골목길도 무척이나 정겹다. 발길 닿는대로 걷다보면 너울너울 이어진 한옥 골목길이 나오는데, 대체로 집들은 아담하며 소박하다. 사람이 살 것 같지 않아 굳게 닫힌 대문 틈으로 내부를 엿보니 가지런히 신발 몇 켤레가 놓여있다.


박노수 화백의 마음을 담은 미술관
서촌 마을의 골목 끝에는 그림같은 집이 하나 있다. 1972년부터 2011년까지 박노수 화백이 거주했던 집으로 2013년 화백이 종로구에 기증하면서 미술관이 된 ‘종로구립 박노수미술관’이다. 박노수 화백은 한국화의 전통과 현대를 잇는 한국 화단의 대표인물 중 하나다. 광복 이후 대학에서 한국화 수업을 받은 1세대이자, 독창적인 화풍을 창조해낸 화가로 평가받으며 한국 화단의 대표작가로 활동했다.
화백의 작품을 감상하기 위해 미술관으로 들어갔다. 미술관이라 부르기엔 친구 집처럼 마냥 포근하다.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해서 맨발로 문턱을 넘었다. 반들반들한 마룻바닥에 디딘 맨발이 한편 부끄럽기도 하고, 오래전 이 문턱을 넘어 집으로 들어섰을 화백의 모습이 그려져 미소를 짓게 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추임새처럼 ‘삐걱 삐걱’ 울리는 나무 바닥 소리가 정겹다. 때마침 미술관은 화백의 작고 2주기 기념전 ‘수변산책’이 한창이었는데, 안방, 부엌, 서재, 다락방 등이 그의 작품들로 꾸며졌다. 미술관에는 미술작품뿐만 아니라 작가가 생전에 꾸며놓은 나무와 돌멩이들이 오밀조밀 모여있는 예쁜 정원도 만나볼 수 있으며, 뒤편의 산책코스 또한 빼놓지 말아야 한다. 산책로에 올라 가옥의 기와지붕과 우뚝 솟은 굴뚝, 그리고 싱그러운 나무들이 내려다보이는 풍경이 이 미술관의 마지막 작품이기 때문이다.
서촌을 유유히 이정표 없이 걸었다. 차를 타고 지나갔다면 놓쳤을 풍경들이 눈앞에 펼쳐졌다. 서촌에 머무르는 작가들의 작고 허름한 작업실, 길 위에 소소하게 펼쳐진 공방의 소품들, 세탁소 문틈으로 빼꼼히 고개 내민 장미 한 송이, 그리고 정겨운 사람들의 목소리···. 온몸과 마음으로 길을 껴안으며 걸음을 걸었다. 시간을 가장 우아하게 잃을 수 있는 곳, 서촌이 자신에게로 와 길을 잃으라 손짓한다.
서촌 마을의 골목 끝에는 그림같은 집이 하나 있다. 1972년부터 2011년까지 박노수 화백이 거주했던 집으로 2013년 화백이 종로구에 기증하면서 미술관이 된 ‘종로구립 박노수미술관’이다. 박노수 화백은 한국화의 전통과 현대를 잇는 한국 화단의 대표인물 중 하나다. 광복 이후 대학에서 한국화 수업을 받은 1세대이자, 독창적인 화풍을 창조해낸 화가로 평가받으며 한국 화단의 대표작가로 활동했다.
화백의 작품을 감상하기 위해 미술관으로 들어갔다. 미술관이라 부르기엔 친구 집처럼 마냥 포근하다.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해서 맨발로 문턱을 넘었다. 반들반들한 마룻바닥에 디딘 맨발이 한편 부끄럽기도 하고, 오래전 이 문턱을 넘어 집으로 들어섰을 화백의 모습이 그려져 미소를 짓게 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추임새처럼 ‘삐걱 삐걱’ 울리는 나무 바닥 소리가 정겹다. 때마침 미술관은 화백의 작고 2주기 기념전 ‘수변산책’이 한창이었는데, 안방, 부엌, 서재, 다락방 등이 그의 작품들로 꾸며졌다. 미술관에는 미술작품뿐만 아니라 작가가 생전에 꾸며놓은 나무와 돌멩이들이 오밀조밀 모여있는 예쁜 정원도 만나볼 수 있으며, 뒤편의 산책코스 또한 빼놓지 말아야 한다. 산책로에 올라 가옥의 기와지붕과 우뚝 솟은 굴뚝, 그리고 싱그러운 나무들이 내려다보이는 풍경이 이 미술관의 마지막 작품이기 때문이다.
서촌을 유유히 이정표 없이 걸었다. 차를 타고 지나갔다면 놓쳤을 풍경들이 눈앞에 펼쳐졌다. 서촌에 머무르는 작가들의 작고 허름한 작업실, 길 위에 소소하게 펼쳐진 공방의 소품들, 세탁소 문틈으로 빼꼼히 고개 내민 장미 한 송이, 그리고 정겨운 사람들의 목소리···. 온몸과 마음으로 길을 껴안으며 걸음을 걸었다. 시간을 가장 우아하게 잃을 수 있는 곳, 서촌이 자신에게로 와 길을 잃으라 손짓한다.



















